[월간 금융계 / 이보우 편집위원]
새봄의 새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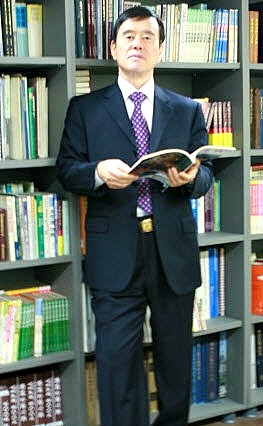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외환은행
여신금융협회상무이사
(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무겁고 긴 외투를 벗어도 좋을 듯하다. 지평선 저 너머로 달려나가고 싶다. 봄의 향기를 마음껏 마시고 싶다. 나는 봄을 좋아한다. 계절치고 나름의 자랑이 없기야 하련만 봄은 다른 절기에 비할 바 없다.
봄에 찾아오는 훈훈한 바람을 나는 좋아한다. 살을 에는 겨울 바람에 거의 지치다시피 할 즈음에 스스로 남풍(南風)을 보내온다. 그는 크게 소리 내면서 오는 게 아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창문을 열어 재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는 이미 사립문에 이르렀다. 그 바람에 따라 봄 꽃 들이 꽃망울을 내밀기 시작한다. 목련이요, 개나리, 그리고 산록 어디선가 떼를 지어 살아가는 진달래들이다. 이들 봄 꽃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좋다. 꽃 중의 왕이라는 모란이나 향기 짙은 장미는 너무도 화려하여 가까이 하기가 부담이다. 언제 시들어 갈지도 도리어 마음을 졸인다. 안쓰럽다. 너무 잘 난 인간이나, 고래등 대가(大家)가 어느 아침에 몰락해가는 모습 같아서다.
봄 꽃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지더라도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다. 목련처럼 후세를 기약하기도 하고 또 달리는 내년에 다시 온다는 기약을 한다.
꽃이 지며 나오는 잎새들이 그 약속의 징표며, 다음 해 꽃을 만드는 일군이기도 하다. 그래서 온 여름 이글거리는 태양을 맞으며 한 겨울의 한설(寒雪)을 참아가며 꽃망울을 만든다.
이 봄에는 새 정부가 들어온다. 봄의 정기를 받아 왔으면 한다. 그는 봄날의 남풍 같으면 좋겠다. 얼어붙은 대지를 녹여주고 훈훈한 온기가 이 땅을 덮여주는 힘이 있었으면 한다. 남풍의 온기는 소통과 통합이 주성분이다. 치열한 각축의 선거 이후 이제는 어느 방향이었든 모든 이들이 같은 배를 탔다. 계층, 세대, 지역에서 틈이 생기면 온기는 소리 없이 빠져나가게 된다. 온기가 없는 봄은 봄이 아니다. 봄이 왔다고 하나 봄 같지 않는 세상이다.
새 정부는 약속이 지켜지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FTA와 같은 국가간 약속도 깨자는 ‘굿판’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행복의 시대를 기대한다. 인기(票)를 쫓아 퍼주자는 시대는 아니었으면 한다. 파이를 키우는 시대, 곳간을 채우는 세상이었으면 한다.
봄이다. 새 정부에 새 희망을 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