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이창현 기자]
번역 제목들
‘희무정’이라 불린 『레미제라블』
『아라비안나이트』는 ‘千一夜話’인가 ‘千日夜話’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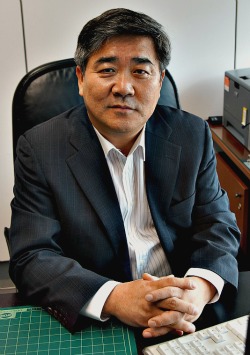
현) 한국산업은행 자금결제실장
1958년 경북 감포
대구상업고등학교/건국대 경영학과
일본 게이오대학 상학 석사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977년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 과장/방카슈랑스사업단장
구미지점장
번역한 문학작품의 제목 중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제법 있다. 몇 가지 더 예를 들어 보자. 『아라비안나이트』를 예전에는 주로 『천일야화』라 했다. 나이 사십이 되도록 『千日夜話』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千一夜話』였다. 이것도 몰랐을까 내심 부끄러웠지만, 재미있기도 하여 가끔 번역된 제목들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영어로는 『One Thousand and One Nights』, 일본에서는 『천야일야(千夜一夜)이야기』라 한다. 중국에서는 『일천영일야(一千零一夜)』 또는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란 뜻으로 『천방야담(天方夜譚)』이라고도 하는 모양이다.
‘삼총사(三銃士)’는 자주 쓰는 낱말이지만 내가 가진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세 명의 단짝 또는 아주 친하여 늘 함께 어울려 다니는 세 사람을 비유하여 하는 말인데, 알렉상드르 뒤마 페르의 소설 삼총사(Les Trois Mousquetaires)에 나오는 달타냥과 세 명의 총사에서 유래하였다. 활 쏘는 사람을 궁사라 하듯, 총 쏘는 사람은 총사라 한다. 달타냥의 친구들이 총사대에 소속되었기에 그리 부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소설에는 총으로 싸우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삼총사들이 총사대 소속이기는 하지만, 주된 개인무기는 총이 아니라 칼이다. ‘삼총사’가 아니라 ‘삼검사’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는 『삼검객(三劍客)』이란 제목을 달고 있는 듯하다.
번역 제목을 말하면서 『춘희』를 빼놓을 수는 없겠다. 위의 『삼총사』의 작가인 뒤마 페르의 사생아로 태어난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소설이다. 그는 소설을 희곡으로도 각색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베르디는 이를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로 만들어 선풍을 일으켰다. 프랑스어 소설의 제목은 『La Dame aux camélias』, 영역본 제목은 『The Lady of the Camellias』이니 우리말로는 “동백꽃의 귀부인”이나 “동백아가씨” 정도가 된다. 오페라 제목인 ‘La Traviata’는 이탈리아어로 “타락한 여자”, “길을 잃은 여자”쯤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소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번역한 『춘희(椿姬)』로 쓴다. 한자 춘(椿)은 일본에서는 동백나무를 뜻하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참죽나무를 가리킨다. 참죽나무가 어떻게 생긴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지만, 동백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백(冬柏)나무를 ‘산다(山茶)’, 동백꽃을 ‘산다화(山茶花)’라고도 하는데,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모양이다. 다시 위키피디스를 보니 중국에서는 『춘희』를 『다화녀(茶花女)』라 적고 있다. 참죽나무 춘(椿)은 신령스러운 나무를 가리키기도 하며, 장수를 비유하는 글자이기도 하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낱말 중에는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춘부장(椿府丈)’이 있다. 지금 와서 ‘춘희’를 ‘동백아가씨’로 고쳐 부르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유래는 그렇다는 것이다.
어느 날,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나도 모를 문제를 하나 던져봤다. 미국 소설 『분노의 포도』에서 ‘포도’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었다. 책을 읽지 않아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분노의 포도』가 존 스타인벡의 작품인줄은 잘도 안다. 학창시절 시험공부 하느라 무작정 외웠기 때문이다. 열 명 쯤 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다. 과일 ‘포도(葡萄)’와 포장도로를 줄인 ‘포도(鋪道)’였다. 목소리 큰 사람들의 그럴듯한 설명들이 오가는 중에, 누군가 재빨리 스마트폰을 검색했다. 영어 제목 『The Grapes of Wrath』가 뜬 모양이다. 우문우답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히 해결되었지만, 껍데기 교양의 허무감은 시간이 지난 지금껏 남아 있다.
단테의 서사시 『신곡』도 제목의 변천이 복잡하다. 단테가 붙인 제목은 ‘희극(喜劇)’을 뜻하는 『Commedia』였다. 지옥이라는 절망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해피엔딩하고, 어려운 라틴어가 아니라 쉬운 속어인 토스카나어로 적었기에 그렇게 붙인 것이다. 1321년 작품이 완성된 후에는 『단테』 또는 『삼행운시(三行韻詩)』 등으로 불렸는데, 단테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예찬한 보카치오가 ‘신성한(Divina)’이란 관사를 붙였고, 약 200년이 지난 1555년 베네치아에서 『신성희극(神聖喜劇·La Divine Commedia)』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신곡(神曲)』이란 한자말 제목은 1902년 일본의 모리 오가이(森鴎外)가 번역한 안데르센의 장편소설 『즉흥시인』에 처음 나온다고 한다. 이후 일본에서는 『신곡』이란 이름이 정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듯하다.
캐나다의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쓴 『Anne of Green Gables』의 우리말 제목이 『빨강머리 앤』과 『빨간 머리 앤』 중 어느 것이 옳은지는 여기에서 논외로 하지만, 제목을 단 과정이 재미있다. 또 일본이야기라서 죄송하지만, 일본사람이 번역한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쓴 듯하다. 이 책이 우리말로 소개된 것은 이화여고 교사였던 신지식 여사가 1962년 일본어 번역을 중역하여 이화여고 주보 「거울」에 게재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1952년 무라오카 하나코(村岡花子)가 번역하여 ‘창가의 소녀(窓辺に倚る少女)’란 제목을 붙이려 했으나, 출판사는 ‘빨강머리의 앤(赤毛のアン)’을 권하였다. 번역자는 결국 스무 살 딸의 의견을 받아들여 ‘빨강머리의 앤’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원제목에 나오는 ‘게이블(gable)’은 옆면이 시옷자 모양(∧)으로 된 맞배지붕을 뜻한다. ‘푸른(green) 맞배지붕의 앤’이 ‘빨강(red)머리의 앤’으로 변한 것이다. 푸르고 붉은 색의 수채화 한 폭이 그려지는 듯하다.
번역본은 아니지만, 알기 어려운 책 이름 중의 하나로 김시습의 『금오신화(金鰲新話)』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데, 금오산에서 썼기에 붙은 이름이다. 여기의 금오산은 경주 남산을 말하는데, 구미의 금오산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경주 금오산의 ‘오(鰲)’는 자라를 뜻하는데, 산 전체가 경주 시내를 내려다보는 자라 모양을 하고 있다. 구미 금오산은 金烏山으로 쓰는데, ‘금오’는 태양에 사는 발이 셋 달린 까마귀 곧 삼족오(三足烏)를 가리킨다. 흔히 『금오신화』를 중국 명나라의 구우(瞿佑)가 쓴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하는데, ‘전등’이란 뜻이 재미있다. 처음에는 강화도의 전등사(傳燈寺)를 연상하였는데, 알고 보니 한자가 다르다. 전등(剪燈)의 ‘전’은 ‘자르다’는 뜻이다. 나뭇가지를 치는 것을 ‘전지(剪枝)’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가위는 ‘전지가위’다. ‘전등’은 등불의 심지를 자른다는 뜻이다. 밤에 등불을 켜고 책을 읽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심지가 타들어가 불빛이 약해진다. 이때 심지를 올려 탄 부분을 잘라내면 불꽃이 다시 밝아진다. 얼마나 재미있으면 불탄 심지를 잘라가며 읽는 책일까?

